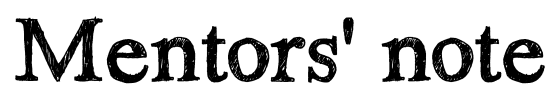옛날 노나라에 아들 셋을 둔 사람이 있었다. 맏아들은 착실하나 다리를 절었고 둘째는 호기심도 많고 몸도 온전했다. 막내는 경솔한 편이었으나 남들보다 민첩했다. 평소 무슨 일을 하면 막 내가 늘 가장 빨리 했고, 둘째가 그 다음이었으며, 맏아들은 애를 써도 겨우 일을 마칠 정도였으나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는 법이 없었다.
하루는 둘째와 셋째가 태산 일관봉을 먼저 오르는 내기를 걸고 신발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것을 본 맏아들도 준비를 하기 시작했으나 아무도 맏아들이 일관봉에 오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조선 초기의 학자인 강희맹이 아들을 훈계하기 위해 지은 ‘훈자오설'(訓子五說) 가운데 하나인 ‘등산설'(登山說)에 나온다. 이야기의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
셋 중 단 한 명만 태산 일관봉의 정상에 올랐는데, 바로 다리가 불편한 맏아들이었다.
막내는 산 중턱에도 오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민첩함만을 믿고 산기슭에서 이리저리 의미없이 돌아다니기만 했다. 시간이 흐르고 해는 졌다. 막내는 내기에서 졌다. 생각이 짧았던 막내는 산 속에서는 해가 빨리 떨어 진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둘째는 산 중턱까지만 오를 수 있었다. 등산 초기에 둘째는 쏜살같이 달려 나가 산 중턱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호기심이 많은 둘째는 ‘일관봉 정상 오르기’라는 목표를 잃어버린 채 이 곳 저 곳을 돌아다녔다. 시간은 흘러 해는 떨어졌고 그는 바위 아래서 밤을 보내야했다.
맏아들은 가장 느렸지만 셋 중 유일하게 정상에 올랐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그는 한발 한발 지속성을 갖고 걸었다. 둘째, ‘태산 일관봉 정상 오르기’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것이 그가 이긴 이유의 전부다. 너무 단순한가? 맞다. 그러나 이 단순한 것을 실행하기 그렇게 어렵다. 상식적인가? 물론이다. 하지만 정말 비상식적인 것은 이런 상식이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여기서 속도는 ‘빠름’이다. 개인, 기업, 국가 모두에게 빠른 것은 이제 미덕이 되었다. 하지만 빠름의 강조는 반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스피드로 인한 공허감과 부실화에 대한 대응으로 ‘느림’의 힘과 미덕이 대두되었다. 나는 빠름과 느림의 두 덩어리가 융합하여 뭔가 꽤 괜찮은 것을 만들어내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몇 년째 양방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어느 날,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과연 빠름에 답이 있는가?’, ‘그럼 느림에 답이 있는가?’ 나는 이 질문이 우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개인, 조직, 국가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임을 말이다.
나는 지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빠름은 동적이고 느림은 정적이다. 지속은 동적이며 정적이다. 지속은 유지다. 개선은 혁명이 아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개선은 혁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것은 빠름이나 느림이 아니라 지속에 있다. 지속 속에는 기는 것, 걷는 것, 뛰는 것, 멈추는 것이 모두 들어있다. 아기를 보라. 아기가 걷게 되는 과정을 보라. 지속성의 증거를 볼 수 있다.
◊ 토끼가 경주에서 진 이유는 잠을 잤기 때문이 아니다. 오래 달리기나 마라톤이었다면 결국 토끼는 졌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긴 삶을 간다.
◊ 그럼, 지속성이 만병통치약인가? 아니다. 나는 어리석은 일관성에 빠진 사람과 조직을 여럿 봤다. 18세기 독일의 작가이자 비평가인 고트홀트 에프라임 레싱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가장 천천히 달리는 사람도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면, 목표 없이 헤매는 사람보다 빠르다.” 둘째가 첫째에게 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빨랐지만 목표에 집중하지 않았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은 곧 초점이다. 지속성에 ‘초점’을 더하라! 초점을 유지하고 지속하라! 증거가 필요하다면 돋보기로 종이에 불을 내보라.